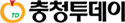20년하고도 한참 전에, 시나리오 작가가 되기 위해 충무로를 기웃거렸다. 영화가 애인처럼 좋았다. 치명적인 짝사랑이었다. 하지만 돈이 문제였다. 벌이가 안 된다는 이유로 결혼할 여자집안에서 파혼을 들먹였다. 극장을 택하느냐, 결혼식장을 가느냐의 갈림길에서 결국 사랑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영화 꿈을 접었다.
▶기자가 되고 '글'이 '밥'이 됐다. 하지만 밥벌이를 위한 글은 썩어있었다. 글이 아니라 밥과 맞바꾸는 알량한 거래였다. 한동안 글을 쓸 수 없었다. 글 쓰는 일이 노동의 일부가 되자 글은 쓰여지지 않았다. 자기만 만족하는 글은 피드백이 없는 법이다. 자화자찬의 껍데기다. 어떻게 쓸까 장고에 들어갔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스스로를 연민했다. 미웠던 감정을 추스르자 용서가 됐다. 결론은 온기(溫氣)였다. 글에 따뜻함을 담고자 노력했다. 물론, 글이란 남을 위로해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본인이 치유 받는 것이다. 들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얘기를 들려주는 것이고, 남을 이해하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라 이해받고 싶어서 쓰는 것이다. 글에서 온기가 느껴질 즈음 내 글을 마주할 용기가 생겼다.
▶'충청로'라는 타이틀로 칼럼을 쓴 게 벌써 10년이다. 매주 한차례씩 500회를 채웠다. 원고지 4000매 분량이니 책으로 묶으면 3~4권 정도다. 따뜻하게 읽어준 독자가 제법 있었다. 당연히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쓸 수밖에 없었다. 어느 해 어느 봄날, 울먹이던 어느 여성 독자(讀者)의 피드백이 기억에 남는다. 세상살이가 힘들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가 칼럼을 읽은 후 생명줄을 잡았다고 했다. 눈물이 핑 돌았다. 감동을 받은 건 내 쪽이었다. 감동은 완전한 동감이다. 10년은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었다. 글쓰기도 오래하면 글에 근육이 생긴다. 자평하건대, 어느 샌가 글에서 온기(溫氣)가 빠졌다고 생각한다. 지친 글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든다. 500회는 그 임계점이다. 글은 잘 쓰는 것 못지않게, 못난 글을 피하는 법 역시 중요하다고 믿는다. 언젠가 내 글을 다시 마주할 용기가 생길 때까지 칼럼을 접기로 했다. 같은 시선에는 함께 갈 길이 보인다. 10년간의 기억이 추억으로 치환되고 있으니 난 행복한 사람이다.
※독자여러분, 고마웠습니다.
나재필 편집부국장 najepi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