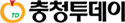[거리의 시인들]
땅이 부족하면 하늘의 공간을 사용하자. 거두절미하고 용적률 '리모델링'이 우선이다. 도심 팽창의 한계는 '위'로 올리면 해결된다.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에서 용적률 규제로 다세대 건축물은 밑으로 파고들었다. 유사시 방공호로나 사용해야 할 지하공간은 사람이 오래 머물기엔 부적합하다. 평시에 주차장과 창고 용도일 뿐이다. 지상 공간을 더 올리자.
청년 시절 자취방은 주택가 북서향 1층이었다. 해가 오후에 잠깐 들어오기 무섭게 금방 어둑해졌다. 겨울의 추위 빼고는 여름에 서늘했고 바람은 그럭저럭 통한 까닭에 저렴한 집세로 만족했다. 어차피 잠만 자던 곳이었으니 상관없었다. 인근에 더욱 저렴한 친구의 반지하 자취방은 습하고 쾌쾌했다. 채광은 둘째치고 통풍까지 막혔다. 친구들의 아지트로 삼아 왁자지껄한 야단법석을 잠재우기엔 지하공간만큼 만만한 곳은 없었지만, 웃음꽃과 더불어 곰팡이꽃이 동거했다. 곰팡내인 듯 하수구 냄새인 듯 정체를 알 수 없는 냄새를 덮기 위해 친구는 세제를 아끼지 않았다. 친구의 빨랫감은 속옷과 양말 종류가 전부였음에도 방안 곳곳을 휘감은 섬유유연제 향기와 달리 눅눅한 기운이 그곳을 떠나질 않았다. 가난한 청년의 자취방에 건조기는 고사하고 공기청정기는 '넘사벽'이었다. 방향제 때문에 반지하 방은 더 숨 막혔다.
누군가에게는 추억의 공간이고 누군가에게는 지긋지긋한 현실이었다. 차라리 옥탑방에 살고 말지, 빛을 보기 위해 빚내서라도 지상으로 올라가겠다던 친구의 혼잣말은 나에게도 실현해야 할 현실이었다. 유년 시절 남향의 시골집 마루에 앉아 있으면 한겨울에도 춥지 않았다. 마당에 널어놓은 이불은 석쇠로 구운 마른 김 마냥 뽀송뽀송했다. 햇볕은 난방기였고 바람은 선풍기였다.
태양이 실내를 환하게 감싸준다. 바람이 바깥 신선한 공기를 실내로 넣어주며 오염된 공기를 밀어낸다. 콘크리트 도시에서는 태양과 바람 모두 돈을 주고 사야한다. 태양과 바람은 선인과 악인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제공되지만, 도시에서는 피땀 흘려야 손에 쥘 수 있는 주거 '자산'이다. 지갑이 얇을수록 일조량이 얇아진다. 같은 단지 같은 평수 아파트조차 일조권에 따라 집값의 차이가 벌어진다.
최근 대전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지역 건설사 참여시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 개선안을 내놨는데 두고 볼 일이다. 규제를 손질하고 정책에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용적률 제한… 인제 그만 놓아주자. 그늘이 지더라도 바람만이라도 제대로 통해야 할 것 아닌가. 땅은 임자가 있어도 하늘은 그렇지 않다. 거듭 말하지만, 하늘의 공간을 마구 사용해야 한다. 우리 위로 올라가 서로를 '위로'해보자.
문인수 기자 mooni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