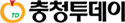나는 중증외상환자를 치료하는 외상외과의사다. 외상외과의사는 외상으로 인한 손상 환자를 치료하는 외과의사이다. 수술을 주업으로 하며, 동시에 응급실부터 중증외상치료를 중심으로 한 중환자치료도 담당하고 있다.
응급실 안 여기저기서 아픈 사람들의 아우성이 들린다. 서로들 본인이 먼저 왔다고, 더 많이 아프고 더 피가 난다면서 빨리 치료해달라고 소리를 지른다. 하지만 권역외상센터 같은 곳에서는 목소리 큰 환자, 먼저 온 환자가 아니라 ‘환자 중증도’에 따라 치료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 등 객관적인 기준을 근거로 병원 전 단계부터 평가해 심각하고 빠른 처치가 필요한 환자부터 치료하는 것이다.
서로들 아프다는 목소리 사이로 더 큰 인공 아우성이 들려온다. 바로 구급차 사이렌 소리다. 대부분 병원 근처 마지막 사거리를 지나면서 자연스레 볼륨을 줄이지만, 응급실 입구까지 큰 사이렌 소리를 퍼뜨리며 급하게 들어오는 구급차에는 분명 중환자가 탑승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피비린내가 채 가시지 않은 환자는 분명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환자일 것이다.
내가 담당하는 ‘중증외상환자’라는 이름표가 달린 환자는 오히려 조용하다. 마지막 신음소리만 간신히 낼 정도이거나 더 심한 경우 아프다는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 중증외상환자는 중요 장기가 있는 머리, 가슴, 배, 골반을 확인하면서 치료를 시작한다. 응급 초음파부터 시작해 이동식 X-ray, CT 등 순차적인 검사를 통해 환자의 다친 부위들을 확인해 나간다. 이러한 과정들이 여러 의료진에 의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피가 여기저기 낭자되는 것들이 조금씩 수습된다. 동시에 환자 몸에 굵은 관을 꽂아 넣기 시작하고, 수액과 새빨간 혈액이 쉼 없이 공급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긴박한 외상소생실 안 상황이 전혀 파악되지 않을, 응급실 안 목소리 큰 누군가는 또 본인 손가락에 피가 난다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다. 그 순간 외상소생실에서 벌어지는 생존을 향한 사투는 절정을 향해 간다. 붉은 피를 비롯해 승압제, 수액, 산소 등이 각각의 역할에 맞게 환자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 공급된다. 하지만 그 순간까지 중증외상환자는 말이 없다. 두툼한 겉옷을 입은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높은 공사장에서 일하다 떨어져 온몸에는 흙 범벅이며 굵은 작업화가 발에 걸쳐 있는 작업자 등…. 스스로 어디 전화할 힘도, 설사 전화할 기력이 있다 하다라도 전화기에 부탁할 누군가의 전화번호 하나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를 살리려는 의료진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한다. 초기 소생술을 무사히 견뎌낸 환자는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 이후 치료에 들어갈 수 있다. 그들도 큰 목소리로 부를 수 있는 가족이 있을 것이고, 각자의 사회 구역에서 목소리를 내며 일하는 곳이 있는 사람들이다. 다만 그들은 남들처럼 사무실에 앉아 모니터를 보는 것 대신 둔탁한 신발을 신고 남들 보다 더 높은 곳에서 일하며, 안전벨트와 에어백이 가득한 큰 차를 타는 것이 아니라 안전장치라고는 헬멧 하나밖에 없는 오토바이를 타면서 일할 뿐이다.
응급실, 권역외상센터 의료진은 목소리 큰 환자 순으로 치료하지 않는다. 목소리가 작다고 해서 치료 순서가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급한 환자를 최우선으로 치료한다. 그렇게 의료진은 목소리도 작고 신음소리조차 간신히 내는 환자라도 귀중한 생명이 더 살 수 있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