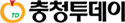선관위 여론조사결과 적극투표 의향률이 59.5%로 집계됐다. 하지만 역대 투표성향에 비춰보면 투표율 50%를 밑돌 수도 있다. 세대 간 투표율 격차도 심각하다. 2006년 지방선거(전체투표율 51·6%) 당시 20대 투표율은 33.9%로 60대(70.9%)의 절반을 밑돈다. 각계가 젊은층 대상으로 투표율 높이기에 나선 이유이기도 하다.
지방선거 본래 의미는 어떤 명분으로도 퇴색될 수 없다.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는 지방자치는 지역의 유능한 일꾼을 뽑는 일에서부터 그 성패가 판가름 난다. 다양한 의사를 통합 조정하고 꿈과 비전을 지역에 심어주는 혁신형 봉사 리더십을 찾기란 그만큼 어렵다. 한번 잘못 뽑아놓고는 임기 내내 주민들이 가슴을 졸인다고 상상해보라.
지역민 삶의 질, 예컨대 주민복지와 지역개발, 지역경제 살리기,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정책을 지역민 스스로 꾸려가는 일, 그 자체만으로도 획기적인 것이다. 하지만 주민 대표를 뽑아 그러한 막중한 과제를 설계·집행하게 하고, 이를 감시·견제하는 지방의회를 구성·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지방의회 부활(1991년) 19년, 자치단체장·지방의원 동시선거(1995년) 15년을 맞았지만 아직도 개선해야 할 대목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선출직 공직자들이 전시성 프로젝트, 방만한 사업 추진으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거나 권력 남용, 횡령, 이권 개입 등으로 검은 돈을 챙기는 현실이 안타깝다. 비리혐의로 사법 처리된 민선4기 단체장만 해도 전체의 절반에 가깝다. 지역 교육대통령으로 불리는 교육감도 예외가 아니다. 사리사욕에 눈 먼 모리배(謀利輩)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지난 4년 동안 재보선 비용은 총 525억여 원으로 주민 혈세만 축냈다. 지방자치공백에다 재정압박까지 초래한 꼴이다. 지방 자치 무용론 내지는 축소론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들의 치명적인 도덕성 결함 또는 자질 부족만을 탓할 일이 아니다. 함량 미달 후보를 고른 유권자에게도 망신이 아닐 수 없다. 상실감은 그 뭣으로도 계량하기 조차 힘들다. 유권자들이 제 역할을 못할 경우 비리 인사에게 내 고장 살림살이를 대(代)를 이어 맡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특정후보 또는 정당, 그들만의 잔치라는 최악의 선례를 남길지도 모른다.
이번 선거는 2012년 총선과 대선으로 이어지는 길목에서 치러지는 전국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향후 정국 풍향을 읽을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 다음 달 28일엔 전국 10여 곳에서 국회의원 재·보선이 시행된다. 선거 이후 각 정당의 권력지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세종시 논란에 이어 개헌카드도 고개를 들게 될 것이다. 차기 대권 후보군의 주변구도가 어떻게 형성돼 갈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다.
세종시를 둘러싼 논란이 어디까지 어떻게 미칠지 충청권으로선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애초부터 무리였다. 충청권이야 죽을 쑤건 말건 정치권 그들만의 의사만 중요한 듯한 오만이 문제다. "다행히 천안함 사태가 바로 인천 앞바다에서 일어났다"는 정치권의 망언 또한 그러하다. 누가 죽건 말건 정파 이익, 득표에 도움이 되면 그만이라는 고백과 뭐가 다른가. 매사가 이런 식이라면 곤란하다.
결론은 하나다. 주민 스스로 나서는 수밖에 없다. 모두 8명을 뽑는 선거방식이지만 이것 또한 유권자들이 감수해야 할 몫이다. 투표소에 가면 먼저 교육감, 교육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4명을 뽑는다. 그 다음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투표지 4장을 받아 2차 투표를 한다. 후보자들의 면면을 잘 모를 경우 특정 정당 기호만 보고 '줄투표'를 하거나 아무데나 찍을 수도 있다.
내 살림이라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수고스럽더라도 각 가정에 배송된 선거 공보물을 통해서라도 적임자를 미리 골라보자. 그래야 투표장으로 가는 발걸음도 한층 가벼워질 것이다. 투표로 말을 하는 유권자이어야 한다. 지방자치 주역의 적극적인 참여는 변혁을 이끄는 우렁찬 함성이나 진배없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