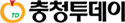▶지난겨울이 그렇게 춥더니, 또 한기가 찾아왔다. 여기저기서 부고(訃告)가 날라든다. 이 계절엔 특히 그렇다. 잊지 않으면 잊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고, 볼 수만 있어도 보인다고 여겼는데, 모두의 안녕을 묻는 이 시간이 황망하고 당황스럽다. 동토(凍土)의 세상이란 언제나 쓸쓸하다. 입이 굳고 말이 굳는다.
이 벼린 겨울이 지나면 차갑고 매정했던 오한마저도 못내 그리울 텐데 '겨우살이'의 어근과 어미가 죽음을 알린다. 그림도 언어다. 풍경도 언어다. 저마다의 얼굴을 가지고 소리를 낸다. 겨울은 '겨울'하고 소리 낸다.
▶어릴 적 말수가 얼마나 적었던지 아버지가 한 말씀 했다. "넌 말을 못하니? 말을 잊었니?" 이 금언(禁言)은 사춘기를 지나, 사추기가 저무는데도 가슴속에서 말을 하고 있다. "왜 말을 해야 하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나?" 하지만 지금도 그때의 선택적 함묵증(침묵)이 옳았다고 생각한다. 하지 말아야 할 말들과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구분하지 못하는 저열한 입심을 경계하는 탓이다. 세상은 말(言)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귀(耳)를 막아도, 눈(目)으로 말(言)이 읽히니 듣지(聽) 않고는 못 배기는 것이다.
▶사람들은 옛날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 마치, 그것이 법이고 양념인 것처럼 너스레를 떤다. 그래서 항상 춥고 배고프고 눈물겹던 지난날들을 업적 읊조리듯 얘기한다. 이 사초(史草)에 따르면 '자신이 가장 힘들게 살았고, 가장 아팠으며, 가장 억울하게 당했다'고 한다. 물론 가장 착했고, 가장 현명했으며, 가장 똑똑했다는 단서조항을 달고서 말이다.
하지만 지금 급한 건 춥고 배고프고 눈물겹던 그때의 기억이 아니라, 춥고 배고프고 눈물겨운 현재의 사정이다. 이 겨울을 견뎌내기도 힘든데, 이 겨울을 견뎌낼지조차 불분명한데 왜 지난날에 갇혀 사는지 도통 모르겠다. 말의 성찬이 지겹고 두렵다.
▶사람은 상처받지 않기 위해 상처를 준다. 만약 상처를 주지 못하면 스스로 상처를 내기도 한다. 그 도구는 말(言)이다. 말랑말랑했던 텍스트는 입을 거쳐 폭력이 된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마디를 하는가. 또 몇 마디를 듣는가. 말들을 주워 담을 그릇은 작다. 하지만 넘쳐흘러도 그냥 퍼붓는다. 분명히 이 말이 저 말 같고, 저 말이 이말 같은데…. 대화는 '둘이 하기 때문에' 다이얼로그다. 혼자만 떠든다면 모놀로그다.
생각의 두터운 법랑질, 생각의 동맥경화가 사람을 지치게 한다. 했던 말을 되풀이하는 말되풀이병(palilali), 이제 좀 되풀이하지 말자. '정해진 방법이 없는 방법(法無定法)'인 동어반복증은 뱉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에게 상처를 남긴다. 입이 곱지 못하다면 차라리 눈과 귀로 말하라. 왜냐고? “말(言)은 똥이다.”
나재필 편집부장 najepi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