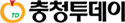▶두 사람의 늙은 사랑이 왜 사람들을 울릴까. 그만큼, 사랑하며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다. 할머니의 살결이 닿지 않으면 잠들지 못하는 할아버지의 버릇은 변주와 파격이 아니라 오래된 습관일 뿐이다. 시큰거리는 무릎을 연신 주무르는 건 봉사가 아니라 위로다. 밭은기침 하는 남편을 밤샘 간호하는 건 고행이 아니라 동행이다. 귀가 어두운 남편을 위해 바짝 다가가 얘기하는 건 동감이 아니라 감동이다. 차려준 밥상을 놓고 ‘맛이 없다’고 투정하지 않은 건 선행이 아니라 배려다. 그래서 곱디곱다.
▶계절이 가고 오듯이, 꽃이 피고 지듯이, 누군가는 왔다가 떠난다. 그리고 그 떠난 자리에 또 다른 누군가가 온다. 부모의 늙어감에도 울지 않는 이 척박한 세상에, 우린 생판 알지도 못하는 촌로(村老)의 생사에 눈물 흘리고 있다. 묵은 눈물이자 '씻김굿'이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남보다도 더 남같이' 사는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인지도 모른다. 그 누가 죽음 앞에 경박할 수 있는가. 그 누가 혁명군처럼 몰아닥치는 죽음을 회피할 수 있는가. '죽고싶다'고 버릇처럼 말하는 건 '살고 싶다'라는 반어법이다. 이대로 죽고 싶지 않으니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는 애원이다. 그래서 죽음은 어떠한 경우라도 억울한 구석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임은 결국 물을 건너시네. 물에 빠져 죽었으니 장차 임을 어이할꼬.(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 강을 건너가려는 님을 앞에 두고서야 비로소 그 님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우리네 삶이다. 강이란 죽음과 이별이다. 건너면 죽음이고, 바라보면 그냥 물이다. 그러니까 강은 사랑의 끝이 아니라 징검다리다. 노인이여, 순순히 어두운 그림자를 받아들이지 마라. 늙음이여, 저무는 하루에 소리치고 저항하라. 분노하고 또 분노하라. 사라져가는 빛들에 대해서도 따져 물어라. 그래야 덜 늙는다. 당신의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이 사랑이다. 그 손이 시리다면 입김을 불어넣어라. ‘호호~'
나재필 편집부장 najepi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