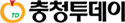▶보부상(봇짐장수·등짐장수)들이 장돌뱅이가 되지 않은 건 상도의를 지켰기에 가능했다. 객주(客主)는 어느 한쪽에서 물건 값을 지불하지 못하면 자기 돈으로 대신 냈다. 또한 흉년이 들면 쌀을 나누는 등 신뢰를 최고 덕목으로 삼았다. 대행수(지도자)는 이 같은 상거래 관습을 토대로 유통질서를 확립했다. 이른바 불완전판매나 사기거래를 줄이려는 것이었다. 지(智)는 순수 우리말 '치'에서 음차한 것으로 우두머리를 뜻한다. 벼슬아치(관원), 구실아치(아전), 갖바치(가죽장인), 옥바치(옥장인), 풀무아치(대장장이), 점바치(점쟁이), 동냥치(거지) 등등…. 사농공상의 통념에 매몰된 조선사회에서 상도(商道)를 깨우쳐준 거상 임상옥이 최고 무역상 반열에 오른 것은 돈을 벌기 위한 장사치가 아니었기에 가능했다.
▶장사치가 장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양아치가 된다. 도덕적 비난을 들어야 할 사람은 1만원짜리 치킨을 새벽까지 팔아야 하는 상인이 아니라 5000원짜리 '통큰 치킨'을 미끼상품으로 해 동네 상권을 죽이는 거대 유통사업자들이다. 착한 기업, 나쁜 기업이라는 딱지는 그가 장사치인지, 양아치인지를 보면 안다. 이들의 최대 생존 전략은 기생(奇生)이다. 자기가 만들어 파는 게 아니라 뜯어먹고 살기 때문이다. 사이가 좋을 때는 '의리' 어쩌고 하다가도 기업사정이 나빠지면 분하다고 억지 쓰는 자들이다. 그래서 상술에 감동이 없다. 돈 몇 푼 지역사회에 던졌다고 해서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여기는 건 제 얼굴에 묻은 똥을 모르는 자의 무식한 소치다.
▶무언가 켕기는 사람이 큰소리친다. 꼴통이라고 비웃음을 받고 있는 자가 떵떵거린다. 거울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 사업가는 사업을 시스템으로 본다. 그러나 장사치는 사업을 눈앞의 돈으로만 생각한다. 양아치 같은 장사치들은 굿판을 걷어라. 그대들의 ‘불법’은 머지않아 드러날 것이고, 우린 곧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나재필 편집부장 najepi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