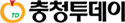넌센스 퀴즈가 아니다. 사람은 일단 차를 보면 위협을 느껴 멈칫하기 마련이다. 반면 운전자들은 그 틈(?)을 놓칠 리 없다.
그래서 열에 여덟, 아홉은 차가 먼저 지나간다. 대전에서 오랫동안 겪은 경험이다. 반면에 보행자가 순간 차량을 못 보았거나 잠시 고개를 숙이고 들어서면 대부분의 자동차는 멈춰 선다.
보행자를 배려해서라기보다는 '횡단보도 사고는 처벌이 크다'는 인식 때문일 것이다. 간혹은 으레 보행자가 설 것이라고 판단했다가 급정지를 해서 서로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부득불 대인 접촉사고가 나기도 한다. 아예 크게 회전을 그리며 이미 건너고 있는 보행자의 앞으로 바짝 붙여 지나가는 악질도 있다. 이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작은 도로인 3~4차선 이하에서의 이야기다. 5~6차선 이상의 큰 도로에 그어진 ‘무신호등 횡단보도’에서는 차가 다 지나간 다음에야 건널 수 있다. 애초 '보행자 우선 및 보호'라는 횡단보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게 우리의 현주소다.
30년 전 호주 시드니에서 겪은 일이다. 어느 주택가 골목도로에 서서 지인의 집을 찾기 위해 무심코 지도책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 때 뒤에서 ‘빠아앙’하는 부드러운 경적소리가 들렸다.
흠칫 고개를 돌려보니 운전대를 잡은 백발의 노신사 한 분이 밝은 미소와 함께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비켜달라고 손짓을 하는 것이었다. 지도책에 빠져 한동안 길을 막고 있었던 것이다. 모름지기 10여초는 족히 됐었을 듯 싶다. 미안함을 넘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한국이었으면 어땠을까? 신호가 바뀌면 3초를 못 기다린다는데….'
더욱 인상적이었던 것은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이 다가서기만 하면 멀찌감치 차가 서는 것이었다. 사람이 있든 없든 멀리서도 횡단보도만 보면 차의 속도를 늦추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는 것이다.
대조적으로 횡단보도에서 조차도 '내 갈 길을 가련다' 가속페달을 밟는 우리의 모습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것도 한 세대 전과의 비교인데도 말이다.
오래 전에 운동을 하다가 무릎을 크게 다친 후 건강을 위해 걸어 다닌다. 그러다보니 버스나 도시철도를 애용한다.
대전의 대중교통 환승체계는 잘 되어있다. 어쩌다 1100원으로 '지하철 한 번, 버스 두 번'의 꽉 찬 환승을 하고 나면 '횡재라도 한 듯' 그리 흐뭇할 수가 없다. 여기에 지하철 내 계단은 '헬스머신' 보너스다. 그러다 ‘무신호등 횡단보도’를 만나면 그 기분을 망치기 일쑤다. 언젠가는 할머니와 어린아이가 손잡고 지나가는데도 마구 들이미는 운전자와 말다툼까지 벌인 적도 있다.
보행환경이 이러한 데도 대전에서 '우선멈춤'이라는 교통표지판을 본 적이 없다. 인구 153만명에 차량 62만여대가 뒤섞인 대도시에 그런 표지판이 없을 리는 없겠지만 본 기억이 없다. 반면에 시드니에서는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는 입구에 어김없이 'STOP'이라는 빨강색의 둥근 표지판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제 우리도 경제 성장에 걸맞게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때가 됐다. 그 출발이 '보행자 우선주의' 의식이라고 생각한다. 보행자는 교통환경을 구성하는 최소한의 기본요소이자, 철저히 보호받아야 할 최대의 약자이기 때문이다.
오늘 한 번, 횡단보도 앞에 정지한 뒤 웃으며 '지나가라'고 손짓을 해보라. 그러면 감동해서 고개 숙여 인사까지 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땐 다시 환한 얼굴로 답례를 하자. 절로 가슴 뿌듯하고 운전이 신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진정으로 '우선멈춤' 표지판이 필요가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