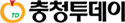'씨~앙놈의 자식'은 시골 동네에서 '상놈의 새끼'를 순화시켜 악의 없이 내뱉는 욕 아닌 ‘욕’이다. 화자는 마을 어르신들이고, 청자는 '말짓'을 일삼는 동네 어린이들이다. 어른들 식의 표현대로라면 덤벙대고 시끄럽게 떠들고 남의 집 유리창 깨 먹고 보리밭을 마구 헤쳐놓는 아이들의 말썽 자체가 시골 동네의 '씨~앙놈의xx'이다. 가족까지 욕 먹이는 언어 구사법으로 대다수의 동네 아이들치고 저 말을 들어보지 않은 이가 없었다. 나는 할머니 집에서 태어나 10년여 시골 동네에서 자랐다. 국민학교(초등학교) 입학 전 역사 교과서를 배우기 전에도 양반-상놈의 개념을 이렇게 이해했다.
양반처럼 뒷짐 지고 걷는 할배들의 '에헴' 헛기침은 비언어적인 수신호다. 눈치 빠르게 상대 의중을 파악해야 하는 기술이 시골 사회 능력이었다. 할매들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먹으라'고 보충 설명했다. 거시기가 참 거시기한 상황이었다. 선비처럼 의젓해야 양반놀음 하는데 단언컨대 '점잖은 어린이'는 없었다. 위로 누나가 넷인 기와집 막둥이 B군은 나와 또래였다. 기와집 할매는 손자 B를 극진히 아꼈다. 기와집 할머니 목소리가 들리면 밥 먹을 시간임을 알았다. "우리B 밥 먹어야지" 공터에서 놀다 보면 기와집 B군의 할머니가 그를 데리러 올 때마다 한결같이 외치는 목소리였다. B군은 애지중지 자란 덕에 큰 말썽을 피우지 않았지만, 너무 유순했다.
'씨~앙놈의 자식들'에게는 B군의 이런 점이 문제였다. 어깨동무하며 개울가에 뛰어들어야 하는데도 옷 젖을까 봐 B군 혼자서 빠졌다. 동무들은 B군을 향해 마마보이 대신 '할매보이'라고 놀리기 일쑤였다. 놀다가 놀리다가 누군가 울음을 터트리면 싸움은 끝난다. 애들 싸움이 별 이유 없이 유치하다. 금방 싸우고는 또 금방 어울린다. 그리고 또 쉽게 싸우고… 어린이가 일부러 말썽 피우고 싶은 것이 아닌데 하는 행동이 어른 시각에는 어리숙하기에 말짓처럼 보인다.
마을에서는 평판이 중요했다. 마을회관은 인물됨을 따지는 품평회 장소였다. 누구 집에 숟가락 젓가락 몇 개인지 아는 것은 동네 강아지도 다 아는 정보였고, 이장네 둘째는 똑똑하네(첫째는 엄벙하더니만), 살구나무집 자식들은 예의 바르네(인사를 잘한다), 저 집 자식은 싸가지가 없어(어른을 보면 인사를 해야지) 등등 어른들의 입소문이 한 개인과 가정을 규정했다. 이런 이유로 '동네 어른들한테 인사 잘해라'라는 모친의 당부는 지금도 귓가에 맴돈다. 모친의 당부는 2절로 넘어가면 잔소리로 들리는데 요지는 이랬다. '집에서 잘못하면 내 자식이라서 예쁘게 봐주지만, 밖에서 잘못하면 어미·아비 욕 먹이는 짓이다' 그런데 잔소리로 들린 2절이 살아가면서 나의 행동을 제어했다. 자식 위해 희생하는 부모님을 지켜보며 '말썽' 부리고 싶은 충동을 참아냈다.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 주는 사람에게 다스려진다. 나의 마음에 모친의 훈계 3절 4절 이상 줄줄이 새겨져 있어서 감사하다. 권위의 의자에는 사랑이 앉아 있다.
<거리의 시인들 연재 끝>
문인수 기자 moonis@cctoday.co.kr